내 스승은 화순의 순한 자연과 사람들
"겹겹 인연 쌍봉사에 이끌려 내 스스로를 유배시켰다
법정스님 가르침 잊지 않고 저잣거리 물들지 않으려
솔바람에 귀 씻으며 산다"3층 탑으로 솟은 화순 쌍봉사 대웅전 앞에 안내판 두 개가 서 있다. 하나는 '우리나라에 둘밖에 없는 탑 모양 전각'이라고 짧게 쓴 문화재청 것이다. 그 옆 안내문은 대웅전 목조삼존불상을 얼굴 선, 옷 주름까지 살피며 그 가치와 아름다움을 알린다. 해박한 불교 지식과 부드러운 글투가 돋보인다. 26년 전 불이 난 대웅전에서 불상을 업고 나와 구한 농부의 '장한 마음과 용기'도 기린다. 소설가 정찬주가 쓴 글이다.
정찬주는 지장전 목조상 안내문도 썼다. 범종각엔 그가 쌍봉사 종소리에 싣는 축원문 '지금 바로 행복하여지이다'가 걸려 있다. 그는 쌍봉사가 코앞에 내려다보이는 길 건너 계당산 자락에 산다. "쌍봉사와의 인연은 금생(今生)에 겹겹일 뿐 아니라 전생에도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쌍봉사는 그의 할머니가 고향 보성 복내면에서 쌀을 이고 가 불공을 드리던 절이다. 인근 쌍봉마을은 15대조(祖)인 호남 명현(名賢) 정여해 때부터 터 잡은 하동 정씨 집성촌이다. 그는 동국대 국문과 다니던 70년대 소설을 쓰러 모포 하나 들고 수시로 쌍봉사를 찾았다. 쇠락한 절을 혼자 지키던 주지스님은 길게는 한 달씩 그를 기꺼이 먹이고 재워 줬다. 그는 '나중에 불사(佛事)로 쌍봉사를 일으켜 절밥 얻어먹은 빚을 갚겠다'고 맘먹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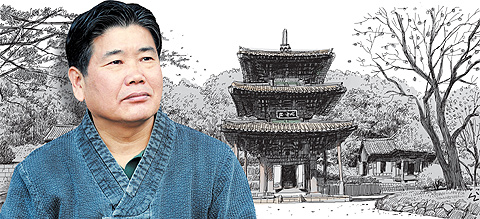
- ▲ 일러스트=이철원기자 burbuck@chosun.com
대학 4학년 때 그 스님에게서 편지가 왔다. '나 이제 생사를 끝낸다/ 얻은 것도 잃은 것도 없다…'는 오언절구 한시(漢詩)가 쓰여 있었다. 정찬주는 스님이 절을 떠나 산으로 들어간 모양이구나 생각했다. 졸업하고 서울서 국어교사를 하던 그는 스님이 강화도 절벽에서 뛰어내렸다는 소식을 1년 뒤에야 들었다. 스님 편지는 절명시(絶命詩)였던 셈이다.
마침 조계종이 월간 불교사상을 낸다고 해서 그는 학교에 사표를 냈다. 불교와 쌍봉사 주지스님에게 진 묵은 빚을 갚을 기회라 여기고 81년 불교사상에 들어갔다. 3년을 온전히 잡지 만들고 경전 읽으면서 불교 공부가 깊어졌다. 그는 84년 샘터사에 있던 대학 선배 정채봉에게 이끌려 일터를 옮겼다.
정찬주는 82년 등단했지만 불교사상과 샘터사 책 만드는 데 빠져 단편만 이따금 발표했다. 그러던 91년 암자 순례에 나섰다. 절이 관광지처럼 돼 가는 속에 청정(淸淨) 공간 암자에 눈길이 갔다. 그는 10년 동안 암자 400곳을 돌며 200곳을 기행문 네 권으로 엮어냈다.
94년엔 만해 한용운의 삶을 담은 첫 장편 '만행'을 낸 뒤로 여러 고승 얘기를 소설로 썼다. 그중에 성철 스님 일대기 '산은 산, 물은 물'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불교 작가'로 이름을 높였다.
정찬주는 인도에 반해 몇 차례 다녀왔다. 거기서 브라만 계급 귀족들이 쉰을 넘어 할 일 다하고 자식 다 키우면 숲으로 들어가 남은 삶을 혼자 보내는 걸 봤다. 자연을 스승으로 모시고 사는 그 임간기(林間期)가 부러웠다. 그는 화순 쌍봉사를 떠올렸다.
2002년 나이 쉰에 그는 30년 서울 삶을 접었다. 쌍봉사 앞에 아담한 기와집을 짓고 이불재(耳佛齋)라고 이름 붙였다. '솔바람에 귀 씻어 불(佛)을 이루겠다'는 뜻이다. 그는 새벽 네 시도 안 돼 눈을 떠 총총한 별을 본다. 뒷산을 한두 시간 걷고 오전엔 글 쓰고 오후엔 밭을 일군다. 집중력이 높아져 한 해 두 권씩 쓰고, 글도 자연을 닮아 유순해졌다고 했다.
정찬주는 농사를 점점 줄여 올해 콩·깨·고구마·고추만 지었다. 생전에 법정 스님이 "많이 짓지 마라, 글 쓰는 일과 본말이 바뀐다"고 일러주신 대로다. 법정은 그의 집 사랑채 편액도 써 주고, 추운 겨울 잘 나라고 내복도 보내 주곤 했다. 그는 법정의 재가(在家) 제자다.
그는 샘터사에서 일하면서 법정 산문집을 열 권 넘게 냈다. 교정지 들고 스님이 계시던 송광사 불일암을 숱하게 드나들었다. 그러면서 스님의 몸가짐을 가까이서 엿보게 됐다. 스님도 좀처럼 꺼내지 않던 속가(俗家) 시절 얘기를 그에겐 들려 줬다.
그는 91년 단오 전날 불일암에 가 법정 스님께 제자로 거둬 주시라고 청했다. 스님은 이튿날 아침 삼배(三拜)를 받고는 '무염(無染)'이라는 법명(法名)을 내렸다. "저잣거리에 살더라도 물들지 말라"는 뜻이라 했다. 오계(五戒)를 내리면서는 "살다 보면 거짓말할 수도, 바르지 않은 길 갈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계(戒)를 생각하면 걸음이 멈출 것"이라고 말씀했다. 정찬주는 "법정 스님이 그 요체(要諦)를 일러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도 불경(佛經)의 숲 속에서 헤매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10년 동안 암자를 다니다 보니 탐내고 노엽고 어리석은 삼독(三毒)이 씻기더라"고 했다. 그래서 결국엔 화순 땅 쌍봉사 앞산에 스스로 암자를 지었다. 그는 그 암자를 '무염산방'이라고 일컬었다. "법정 스님을 불가(佛家)의 스승으로 모신 것이 큰 행운이고 행복이었다"고 했다. 이제 그는 화순(和順)이라는 이름처럼 평화로운 자연, 순한 사람들을 새 스승으로 모시고 산다. |
 스크랩 0
스크랩 0 